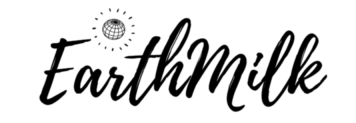며칠 전 모 뉴스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.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‘배민 맛’ 이라는 단어가 유행한다는 내용이었죠.

‘배민 맛’은 음식을 시키기 전의 기대감과, 다 먹고 난 후의 후회가 적절하게 섞인 감정을 표현한 단어입니다.
‘참 재미있는 표현이구나..’
하고 그 맛을 상상해보려던 찰나,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.
‘어? 배민 맛은 미각도, 후각도 아니네?’
하지만 청소년들의 농담 속에서 그 복잡한 감정은 분명 ‘맛’의 범주에 속해 있었습니다.
음식은 혀가 아니라 뇌로 경험한다.

옥스퍼드대학 통합 감각 연구소의 소장인, 또 ‘이그노벨상’(괴짜 과학자의 노벨상) 수상자이자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의 ‘구루’이기도 한 심리학자 찰스 스펜스는 음식은 혀가 아니라 뇌로 맛보는 것이라 정의합니다.
실제로 그는 세계 유수의 레스토랑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그 날의 분위기, 식당의 고도, 조명의 밝기, 식기의 무게, 흐르는 음악에서부터 바삭거리는 소리의 크기, 식사에 얽힌 스토리, 점원의 서비스 까지도 ‘맛 경험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.
식사는 온 몸의 감각을 통해 자연의 음식물과 소통하는 과정이다.
올해 초, 방배 근처의 ‘현미밥카페’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. 오랜 세월동안 음식을 통한 치유를 연구하신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음식점은 도정한지 7일 된 현미로 밥을 짓고, 직접 만드신 나물 반찬과 직접 만든 두부가 메뉴로 나오는 집이었지요.

그 식당에는 참 재미있는 룰이 있었습니다. 바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적어도 40분에서 1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
“음식을 잘 씹다 보면,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이라는게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.”
“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연을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예요.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그 음식에 마땅한 노력을 해야 해요.”
그 날의 음식은 ‘배민맛’과는 거리가 먼, 잘 차려진 채식 식사였습니다. 고기도 없고, 치즈도 없었지만 참 배부르고 만족스럽게. 그리고 속 편하고 깔끔하게 잘 먹었다는 기억이 듭니다.